[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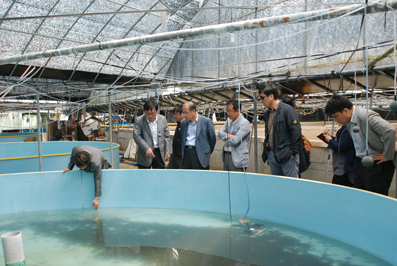
정부가 생사료를 혼용하는 양식어가에도 직불금 일부를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해부터 양식 전 주기에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에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100%를, 배합사료와 생사료를 혼용하는 어가에는 30%를 지급한다.
해수부는 당초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하는 목적이었던 의무화는 이행하지 못하고 정책의 목적을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로 전환했다. 이는 배합사료의 품질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데다 생산어가의 반발 등에 따른 것으로 20년 넘게 배합사료 사용확대를 추진하고도 결국 제자리걸음이 된 셈이다.
해수부가 대안도 없이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수부는 2008년에 배합사료 의무화를 목표로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이어갔으나 제도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됐고 2016년에도 재차 의무화를 시도했으나 해수부는 이내 말을 바꿨다. 2019년 2월 발표한 ‘수산혁신2030계획’에서도 2022년 광어를 시작으로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배합사료의 현장 실증문제로 재차 연기했고 결국 ‘배합사료 사용활성화’로 후퇴했다. 해수부의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는 동안 투입된 정부의 예산은 2000억 원이 넘는다.
당초 배합사료 의무화의 근본적인 목표는 미성어 어획 저감을 통한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오염 방지 등이었다. 하지만 해수부가 하나의 정책을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사이 해양환경은 악화됐고 수산자원은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광어양식장이 밀집한 제주지역에서는 폐사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높은 폐사율의 원인이 바다로 배출되는 사료와 약품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이제 80만 톤대까지 추락했다. 특히 해수부가 배합사료 의무화를 발표한 후 이를 연기하고 철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양어사료 업계는 연구개발(R&D)이나 생산시설 확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해수부의 정책 선회에 대해 수산업계의 전문가들과 배합사료 업계 관계자들은 자조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수부가 당초 배합사료 의무화를 추진하던 목적이 사라진 채 사료구매 지원금으로 변질시킨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고 배합사료 업계 관계자들은 해수부의 정책은 시행될때까지 믿을 게 없다며 기대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해수부가 배합사료 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것은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는데 당초의 목적은 오간데 없고 양식어가의 생산보조금만 남은 형국”이라며 “배합사료 의무화는 어업인의 반발이 심한 데다 국회 등의 압박도 심하다보니 그냥 어업인들에게 원래 주던 예산을 주는 수준이 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수부에서는 배합사료를 혼용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배합사료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사료 사용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양어사료업계가 R&D 투자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서게 돼 전체 양식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어사료업계 관계자는 “해수부가 2022년부터 배합사료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 말을 믿은 양어사료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책을 발표하고 철회하는 일을 20년 동안 반복했는데 누가 해수부 말을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업 입장에서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어종을 위한 배합사료를 생산하고자 R&D를 하기에는 배합사료시장이 너무 작은 것이 사실”이라며 “어차피 해수부도 배합사료 사용을 확대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사료회사가 R&D와 생산시설 확보 등에 파격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